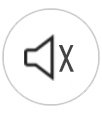мқҙмӢқ мһҘкё° л¶ҖмЎұ, м–ҙл–»кІҢ н•ҙкІ°н• кІғмқёк°Җ?
мғқлӘ…мқ„ кө¬н•ҳлҠ” мӢёмӣҖ: мһҘкё° л¶ҖмЎұмқҳ кёҖлЎңлІҢ нҳ„мЈјмҶҢ
м „ м„ёкі„м ҒмңјлЎң мҲҳл°ұл§Ң лӘ…мқҙ мһҘкё° мқҙмӢқмқ„ кё°лӢӨлҰ¬л©° н•ҳлЈЁн•ҳлЈЁ мғқлӘ…мқ„ мқҙм–ҙк°Җкі мһҲлӢӨ. мӢ¬мһҘ, мӢ мһҘ, к°„, нҸҗ, м·ҢмһҘ л“ұ мЈјмҡ” мһҘкё°л“Өмқҳ кіөкёүмқҖ м—¬м „нһҲ мҲҳмҡ”лҘј л”°лқјк°Җм§Җ лӘ»н•ңлӢӨ. лҜёкөӯм—җм„ңлҠ” л§Өмқј нҸүк· 17лӘ…мқҙ мһҘкё° л¶ҖмЎұмңјлЎң мқён•ҙ лӘ©мҲЁмқ„ мһғкі мһҲмңјл©°, мң лҹҪкіј м•„мӢңм•„ мЈјмҡ” көӯк°Җл“ӨлҸ„ 비мҠ·н•ң мғҒнҷ©мқҙлӢӨ. м„ёкі„ліҙкұҙкё°кө¬(WHO)м—җ л”°лҘҙл©ҙ мһҘкё° кё°мҰқмһҗмқҳ 비мңЁмқҖ көӯк°Җл§ҲлӢӨ нҒ° м°ЁмқҙлҘј ліҙмқҙл©°, м ңлҸ„м Ғ мһҘлІҪкіј мӮ¬нҡҢм Ғ мқёмӢқмқҙ мЈјмҡ” мҡ”мқёмңјлЎң кјҪнһҢлӢӨ.
мҳҲлҘј л“Өм–ҙ, мҠӨнҺҳмқёмқҖ м„ёкі„м—җм„ң к°ҖмһҘ лҶ’мқҖ мһҘкё° кё°мҰқлҘ мқ„ кё°лЎқн•ҳкі мһҲлҠ”лҚ° мқҙлҠ” к°•л Ҙн•ң көӯк°Җ мЈјлҸ„ м •мұ…кіј мӢңлҜјл“Өмқҳ кёҚм •м Ғ мқёмӢқ ліҖнҷ”к°Җ нҒ¬кІҢ мһ‘мҡ©н•ң кІ°кіјлӢӨ. л°ҳл©ҙ мқјліё, лҸ…мқј, н•ңкөӯ л“ұм—җм„ңлҠ” л¬ёнҷ”м Ғ мҡ”мқёкіј лІ•м Ғ мһҘлІҪмңјлЎң мқён•ҙ кё°мҰқлҘ мқҙ лӮ®мқҖ нҺёмқҙлӢӨ. лҜёкөӯ UNOSмқҳ мөңк·ј нҶөкі„м—җ л”°лҘҙл©ҙ 2024л…„ нҳ„мһ¬ мһҘкё° мқҙмӢқ лҢҖкё°мһҗлҠ” м•Ҫ 104,000лӘ…мңјлЎң м „л…„ лҢҖ비 3% мҰқк°Җн–Ҳмңјл©°, нҠ№нһҲ мӢ¬мһҘкіј нҸҗ мқҙмӢқ мҲҳмҡ”к°Җ кёүкІ©нһҲ мҰқк°Җн•ҳлҠ” 추세лӢӨ.
мһҘкё° кіөкёүмқҖ мҷң лҠҳм§Җ м•ҠлҠ”к°Җ? мӢңмһҘкіј м ңлҸ„мқҳ лі‘лӘ© мҡ”мқё
мһҘкё° л¶ҖмЎұмқҳ к·јліё мӣҗмқёмқҖ ліөн•©м ҒмқҙлӢӨ. мғқм „ кё°мҰқ лҸҷмқҳмңЁмқҙ лӮ®кі , лҮҢмӮ¬ нҢҗм • м Ҳм°Ёк°Җ к№ҢлӢӨлЎңмҡ°л©°, мқҳлЈҢ мӢңмҠӨн…ң к°„ нҳ‘л Ҙ л¶ҖмЎұлҸ„ л¬ём ңлӢӨ. лҳҗн•ң л¬ёнҷ”м Ғ, мў…көҗм Ғ мқҙмң лЎң мһҘкё° кё°мҰқмқ„ кәјлҰ¬лҠ” мӮ¬нҡҢ 분мң„кё°лҸ„ м Ғм§Җ м•ҠлӢӨ. лҜёкөӯкіј мҠӨнҺҳмқё л“ұ мқјл¶Җ көӯк°ҖлҠ” "мҳөнҠём•„мӣғ(Opt-out) мӢңмҠӨн…ң"мқ„ нҶөн•ҙ мһҗлҸҷ кё°мҰқ лҸҷмқҳлҘј лҸ„мһ…н•ҙ лҶ’мқҖ кё°мҰқлҘ мқ„ ліҙмқҙкі мһҲмңјлӮҳ, м—¬м „нһҲ л§ҺмқҖ көӯк°Җм—җм„ңлҠ” лІ•м Ғ, мңӨлҰ¬м Ғ л…јмҹҒмқҙ лӮЁм•„ мһҲлӢӨ.
н•ңкөӯ м—ӯмӢң нҳ„н–ү мҳөнҠёмқё(Opt-in) мӢңмҠӨн…ңмңјлЎң мқён•ҙ м Ғк·№м Ғмқё кё°мҰқ лҸҷмқҳлҘј м–»кё° м–ҙл Өмҡҙ мғҒнҷ©мқҙлӢӨ. лҚ”л¶Ҳм–ҙ мқҳлЈҢ진мқҳ мһҘкё° м Ғм¶ң м Ҳм°Ём—җ лҢҖн•ң л¶ҖлӢҙк°җ, к°ҖмЎұл“Өмқҳ л°ҳлҢҖ м—ӯмӢң мһҘкё° кіөкёү мҰқк°ҖлҘј к°ҖлЎңл§үлҠ” мҡ”мқёмңјлЎң мһ‘мҡ©н•ңлӢӨ. лҳҗн•ң мқҳлЈҢкё°кҙҖ к°„ м •ліҙ кіөмң мІҙкі„ лҜёнқЎ, кё°мҰқмһҗ мӮ¬нӣ„ кҙҖлҰ¬ л¶ҖмЎұ л“ұлҸ„ мЈјмҡ” мһҘм• л¬јлЎң кјҪнһҢлӢӨ. OECD ліҙкі м„ңм—җ л”°лҘҙл©ҙ м ңлҸ„м Ғ нҲ¬лӘ…м„ұкіј мӢ лў° кө¬м¶•мқҙ кё°мҰқлҘ мҰқк°Җм—җ мӨ‘мҡ”н•ң м—ӯн• мқ„ н•ҳл©°, мқҙлҘј мң„н•ң мІҙкі„м Ғмқё көҗмңЎкіј мқён”„лқј к°ңм„ мқҙ мӢңкёүн•ҳлӢӨкі нҸүк°Җн•ҳкі мһҲлӢӨ.
лҜёлһҳлҘј мқёмҮ„н•ҳлӢӨ: 3D л°”мқҙмҳӨн”„лҰ°нҢ… мһҘкё°мқҳ кё°мҲ 진ліҙ
3D л°”мқҙмҳӨн”„лҰ°нҢ… кё°мҲ мқҖ мһҘкё° л¶ҖмЎұ л¬ём ң н•ҙкІ°мқҳ м„ лҙүмһҘмңјлЎң л– мҳӨлҘҙкі мһҲлӢӨ. л°”мқҙмҳӨн”„лҰ°нҢ…мқҖ мӨ„кё°м„ёнҸ¬мҷҖ мғқмІҙ мһ¬лЈҢлҘј мӮ¬мҡ©н•ҙ мӢ мһҘ, к°„, мӢ¬мһҘ мЎ°м§Ғмқ„ мқёмҮ„н•ҳлҠ” кё°мҲ мқҙлӢӨ. мөңк·ј лҜёкөӯ н•ҳлІ„л“ң лҢҖн•ҷкөҗ Wyss Institute м—°кө¬нҢҖмқҖ ліөмһЎн•ң нҳҲкҙҖ кө¬мЎ°лҘј к°–м¶ҳ мқёкіө к°„ мЎ°м§Ғмқ„ м ңмһ‘н•ҳм—¬ мҘҗ лӘЁлҚём—җм„ң мғқмЎҙмңЁмқ„ н–ҘмғҒмӢңнӮӨлҠ” лҚ° м„ұкіөн–ҲлӢӨ. мң лҹҪмқҳ CellinkмӮ¬лҠ” мғҒм—…мҡ© л°”мқҙмҳӨн”„лҰ°н„°лҘј м¶ңмӢңн•ҳл©° м—°кө¬мқҳ мғҒмҡ©нҷ”м—җ л°•м°ЁлҘј к°Җн•ҳкі мһҲлӢӨ.
мҳҒкөӯмқҳ л°”мқҙмҳӨкё°м—… л°”мқҙмҳӨн”Ҫм…ҖмқҖ 3D н”„лҰ°нҢ…лҗң мӢ мһҘ лҜёлӢҲмҳӨк°Җл…ёмқҙл“ң(Organoids)лҘј м ңмһ‘н•ҙ м•Ҫл¬ј лҸ…м„ұ н…ҢмҠӨнҠёмҷҖ мқҙмӢқ м „ мһ„мғҒ м—°кө¬м—җ нҷңмҡ©н•ҳкі мһҲмңјл©°, мқјліё мҳӨмӮ¬м№ҙ лҢҖн•ҷмқҖ м„ёкі„ мөңмҙҲлЎң нҷҳмһҗ л§һм¶Өнҳ• л°”мқҙмҳӨн”„лҰ°нҢ… мӢ¬мһҘнҢҗл§ү мһ„мғҒмӢңн—ҳмқ„ 진н–ү мӨ‘мқҙлӢӨ. н•ңкөӯм—җм„ңлҠ” POSTECHкіј м„ңмҡёлҢҖлі‘мӣҗмқҙ кіөлҸҷмңјлЎң л°”мқҙмҳӨн”„лҰ°нҢ… мӢ¬мһҘ нҢЁм№ҳ к°ңл°ңм—җ м„ұкіөн•ҳл©° кҙҖл Ё кё°мҲ л Ҙмқ„ нҷ•ліҙн•ҳкі мһҲмңјл©°, м •л¶ҖлҠ” 2025л…„л¶Җн„° л°”мқҙмҳӨн”„лҰ°нҢ… м—°кө¬м—җ 1,000м–ө мӣҗ к·ңлӘЁмқҳ мҳҲмӮ°мқ„ нҲ¬мһ…н• кі„нҡҚмқҙлӢӨ.
мң м „мһҗ нҺём§‘кіј мӨ„кё°м„ёнҸ¬, мһ¬мғқмқҳн•ҷмқҳ мӢ м„ёкі„
CRISPR-Cas9 мң м „мһҗ нҺём§‘ кё°мҲ кіј мӨ„кё°м„ёнҸ¬ м—°кө¬лҠ” кё°мЎҙ мһҘкё° кё°мҰқмқҳ лҢҖм•Ҳмқ„ м ңмӢңн•ңлӢӨ. мң м „м Ғ кұ°л¶Җл°ҳмқ‘мқ„ мӨ„мқҙкұ°лӮҳ, нҷҳмһҗмқҳ мһҗмІҙ м„ёнҸ¬лЎң мһҘкё°лҘј мһ¬мғқн•ҳлҠ” м—°кө¬к°Җ нҷңл°ңнһҲ 진н–ү мӨ‘мқҙлӢӨ. лҜёкөӯ ліҙмҠӨн„ҙ мҶҢмһ¬ eGenesisмӮ¬лҠ” лҸјм§Җ мһҘкё°м—җм„ң мқёк°„ кұ°л¶Җл°ҳмқ‘мқ„ мң л°ңн•ҳлҠ” мң м „мһҗлҘј м ңкұ°н•ҳлҠ” лҚ° м„ұкіө, мқҙмў…мқҙмӢқ мһ„мғҒмӢңн—ҳ лӢЁкі„м—җ л“Өм–ҙм„°лӢӨ.
мқјліё көҗнҶ лҢҖлҠ” нҷҳмһҗ л§һм¶Өнҳ• мң лҸ„л§ҢлҠҘмӨ„кё°м„ёнҸ¬(iPSC)лҘј нҷңмҡ©н•ң мӢ¬к·јм„ёнҸ¬ мһ¬мғқ м—°кө¬лЎң мЈјлӘ©л°ӣкі мһҲлӢӨ. мң лҹҪм—җм„ңлҠ” лҸ…мқј л§үмҠӨн”Ңлһ‘нҒ¬ м—°кө¬мҶҢк°Җ CRISPR мң м „мһҗ нҺём§‘мқ„ нҶөн•ҙ л§Ңм„ұ мӢ мһҘм§Ҳнҷҳ нҷҳмһҗлҘј мң„н•ң мӢ мһҘ м„ёнҸ¬ мһ¬мғқ м№ҳлЈҢм ңлҘј к°ңл°ң мӨ‘мқҙлӢӨ. көӯлӮҙм—җм„ңлҠ” м°Ёл°”мқҙмҳӨн…Қмқҙ нҷҳмһҗ л§һм¶Өнҳ• мӨ„кё°м„ёнҸ¬ кё°л°ҳ к°„ мһ¬мғқ м№ҳлЈҢм ңлҘј к°ңл°ңн•ҳкі мһҲмңјл©°, KAISTлҠ” CRISPR мң м „мһҗ нҺём§‘мқ„ м ‘лӘ©н•ң мһҗк°Җ мӨ„кё°м„ёнҸ¬ к°„м„ёнҸ¬ мһ¬мғқ н”Ңлһ«нҸјмқ„ м—°кө¬н•ҳкі мһҲлӢӨ.
мқёкіө мһҘкё°мқҳ 진нҷ”
мқёкіө мӢ¬мһҘкіј мқёкіө нҸҗ кё°мҲ лҸ„ лҲҲл¶ҖмӢ л°ңм „мқ„ мқҙлЈЁкі мһҲлӢӨ. лҜёкөӯ н…ҚмӮ¬мҠӨ мӢ¬мһҘм—°кө¬мҶҢлҠ” м„ёкі„ мөңмҙҲлЎң л°°н„°лҰ¬ м—ҶлҠ” мҷ„м „ мқҙмӢқнҳ• мқёкіө мӢ¬мһҘмқ„ к°ңл°ңн•ҳкі мһҲмңјл©°, н”„лһ‘мҠӨ CarmatмӮ¬лҠ” мқҙлҜё CE мқёмҰқмқ„ нҡҚл“қн•ң мқёкіө мӢ¬мһҘмқ„ мң лҹҪ лӮҙ мһ„мғҒм—җ м Ғмҡ© мӨ‘мқҙлӢӨ. мқјліё лҸ„мҝ„лҢҖлҠ” лҜёлӢҲм–ҙмІҳ мқёкіө нҸҗлҘј к°ңл°ңн•ҙ лҸҷл¬ј лӘЁлҚём—җм„ң м„ұкіөм Ғмқё мһҘкё° м§Җмӣҗ нҡЁкіјлҘј мһ…мҰқн–ҲлӢӨ.
мқёкіө м·ҢмһҘмқҖ л©”л“ңнҠёлЎңлӢү(Medtronic)мӮ¬мқҳ мһҗлҸҷ мқёмҠҗлҰ° мЈјмһ…кё°к°Җ мғҒмҡ©нҷ” лӢЁкі„м—җ мһҲмңјл©°, н•ҳлІ„л“ң лҢҖн•ҷмқҖ мқёкіө м·ҢмһҘ мӢңмҠӨн…ңмқ„ нҷңмҡ©н•ң 6к°ңмӣ” мһҘкё° мһ„мғҒмӢңн—ҳм—җм„ң нҳҲлӢ№ кҙҖлҰ¬ м„ұкіөлҘ мқ„ 80% мқҙмғҒмңјлЎң лҒҢм–ҙмҳ¬л ёлӢӨ. көӯлӮҙм—җм„ңлҠ” м—°м„ёлҢҖ мқҳлЈҢмӣҗкіј LGм „мһҗк°Җ кіөлҸҷмңјлЎң м°Ём„ёлҢҖ мқёкіө мӢ¬мһҘнҺҢн”„ к°ңл°ңмқ„ 진н–ү мӨ‘мқҙл©°, м •л¶ҖлҠ” мқёкіө мһҘкё° 분야 кёҖлЎңлІҢ кё°мҲ м„ лҸ„лҘј мң„н•ҙ 'AI мңөн•© мқёкіөмһҘкё° к°ңл°ң лЎңл“ңл§ө'мқ„ л°ңн‘ңн–ҲлӢӨ.
AIк°Җ л§Өм№ӯмқ„ л°”кҫјлӢӨ: мҠӨл§ҲнҠё м•Ңкі лҰ¬мҰҳкіј мҲҳнҳңмһҗ мҳҲмёЎ
AI кё°мҲ мқҖ мһҘкё° кё°мҰқмһҗмҷҖ мҲҳнҳңмһҗ л§Өм№ӯ нҡЁмңЁмқ„ нҒ¬кІҢ лҶ’мқҙкі мһҲлӢӨ. кё°мЎҙм—җлҠ” нҳҲм•Ўнҳ•, мЎ°м§Ғ м Ғн•©м„ұл§Ң кі л Өн–Ҳм§Җл§Ң, AIлҠ” мҲҳмІң к°ңмқҳ мқҳлЈҢ лҚ°мқҙн„°лҘј 분м„қн•ҙ мөңм Ғ мҲҳнҳңмһҗлҘј мҳҲмёЎн•ҳкі , мқҙмӢқ м„ұкіөлҘ мқ„ лҶ’мқёлӢӨ. лҜёкөӯ UNOSлҠ” AI кё°л°ҳ 'Predictive Analytics Engine'мқ„ лҸ„мһ…н•ҳм—¬ лҢҖкё°мһҗ кҙҖлҰ¬ нҡЁмңЁм„ұмқ„ нҒ¬кІҢ н–ҘмғҒмӢңнӮӨкі мһҲмңјл©°, мҳҒкөӯ NHS Blood and TransplantлҠ” лЁёмӢ лҹ¬лӢқ м•Ңкі лҰ¬мҰҳмқ„ нҷңмҡ©н•ҙ мӢ¬мһҘ мқҙмӢқмһҗмқҳ мғқмЎҙмңЁмқ„ мҳҲмёЎн•ҳлҠ” лӘЁлҚёмқ„ мҡҙмҳҒ мӨ‘мқҙлӢӨ.
мҠӨнғ нҸ¬л“ң лҢҖн•ҷмқҖ AIлҘј кё°л°ҳмңјлЎң н•ң к°„мқҙмӢқ нӣ„ н•©лі‘мҰқ мҳҲмёЎ лӘЁлҚёмқ„ к°ңл°ңн•ҳм—¬ мһ„мғҒ мӢңн—ҳм—җм„ң 92% мқҙмғҒмқҳ м •нҷ•лҸ„лҘј мһ…мҰқн–ҲлӢӨ. көӯлӮҙм—җм„ңлҠ” м№ҙмқҙмҠӨнҠёмҷҖ м„ёлёҢлһҖмҠӨ лі‘мӣҗмқҙ нҳ‘л Ҙн•ҳм—¬ AI кё°л°ҳ к°„ мқҙмӢқ л§Өм№ӯ м•Ңкі лҰ¬мҰҳмқ„ к°ңл°ңн•ҳкі мһҲмңјл©°, м„ңмҡём•„мӮ°лі‘мӣҗмқҖ 'AI кё°л°ҳ мһҘкё° м Ғн•©м„ұ мҳҲмёЎ н”Ңлһ«нҸј'мқ„ к°ңл°ң мӨ‘мқҙлӢӨ.
мңӨлҰ¬м Ғ л…јмҹҒкіј лІ•м Ғ 진нҷ”: м–ҙл””к№Ңм§Җ н—Ҳмҡ©н• кІғмқёк°Җ
мң м „мһҗ нҺём§‘, мқҙмў…мқҙмӢқ, мқёкіө мһҘкё° кё°мҲ мқҖ мңӨлҰ¬м Ғ кІҪкі„лҘј мӢңн—ҳн•ҳкі мһҲлӢӨ. мғқлӘ… мңӨлҰ¬ мң„мӣҗнҡҢл“ӨмқҖ мқёк°„-лҸҷл¬ј кІҪкі„, мһҘкё° мғҒн’Ҳнҷ” л¬ём ң л“ұмқ„ 집мӨ‘ л…јмқҳ мӨ‘мқҙлӢӨ. лҜёкөӯ көӯлҰҪліҙкұҙмӣҗ(NIH)мқҖ мқҙмў…мқҙмӢқ мһ„мғҒмӢңн—ҳ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қ„ мғҲлЎӯкІҢ л°ңн‘ңн–Ҳмңјл©°, мң лҹҪ мқҳнҡҢлҠ” л°”мқҙмҳӨн”„лҰ°нҢ… мһҘкё°мқҳ нҠ№н—Ҳк¶Ңкіј мӮ¬мҡ© мЎ°кұҙм—җ лҢҖн•ҙ л…јмқҳн•ҳкі мһҲлӢӨ.
лҸ…мқј мғқлӘ…мңӨлҰ¬мң„мӣҗнҡҢлҠ” мқёк°„-лҸҷл¬ј нӮӨл©”лқј м—°кө¬ мңӨлҰ¬ кё°мӨҖмқ„ к°•нҷ”н–Ҳмңјл©°, мқјліёмқҖ мӨ„кё°м„ёнҸ¬ кё°л°ҳ мқёкіө мһҘкё°мқҳ мһ„мғҒ м Ғмҡ©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қ„ к°ңм • мӨ‘мқҙлӢӨ. н•ңкөӯ м—ӯмӢң 2024л…„ 'мғқлӘ…мңӨлҰ¬ л°Ҹ м•Ҳм „м—җ кҙҖн•ң лІ•лҘ ' к°ңм •мқ„ нҶөн•ҙ мқҙмў…мқҙмӢқкіј мң м „мһҗ нҺём§‘мқҳ м—°кө¬ кё°мӨҖмқ„ мһ¬м •лҰҪн–Ҳмңјл©°, көӯк°ҖмғқлӘ…мңӨлҰ¬м •мұ…м—°кө¬мӣҗмқҖ кҙҖл Ё мңӨлҰ¬ к°Җмқҙл“ңлқјмқёмқҳ көӯм ң мЎ°нҷ”лҘј мң„н•ң м—°кө¬лҘј м°©мҲҳн–ҲлӢӨ.
л°”мқҙмҳӨ мӮ°м—…мқҳ мғҲлЎңмҡҙ лё”лЈЁмҳӨм…ҳ: мЈјмҡ” кё°м—…кіј нҲ¬мһҗ лҸҷн–Ҙ
кёҖлЎңлІҢ л°”мқҙмҳӨ кё°м—…л“ӨмқҖ мһҘкё°мқҙмӢқ лҢҖмІҙ кё°мҲ м—җ м Ғк·№ нҲ¬мһҗ мӨ‘мқҙлӢӨ. лҜёкөӯмқҳ мң лӢҲнӢ° л°”мқҙмҳӨн…ҢнҒ¬лҶҖлЎңм§ҖмҷҖ мҳӨлҘҙк°Җл…ёліҙ(Organovo), мқҙмҠӨлқјм—ҳмқҳ л°”мқҙмҳӨнғҖмһ„, н•ңкөӯмқҳ л©”л””нҸ¬мҠӨнҠё, нҒҗлқјмјҲ л“ұмқҖ мң л§қн•ң кё°м—…мңјлЎң кјҪнһҢлӢӨ. кёҖлЎңлІҢ м»Ём„ӨнҢ…мӮ¬ PwCм—җ л”°лҘҙл©ҙ, мһҘкё°мқҙмӢқ кҙҖл Ё л°”мқҙмҳӨ мӢңмһҘ к·ңлӘЁлҠ” 2035л…„к№Ңм§Җ м•Ҫ 200мЎ° мӣҗм—җ мқҙлҘј м „л§қмқҙл©°, лІӨмІҳмәҗн”јнғҲ нҲ¬мһҗлҸ„ 2025л…„ кё°мӨҖ м „л…„ лҢҖ비 25% мҰқк°Җн•ң кІғмңјлЎң лӮҳнғҖлӮ¬лӢӨ.
лҜёкөӯ мәҳлҰ¬нҸ¬лӢҲм•„мЈј кё°л°ҳ мҠӨнғҖнҠём—… Viscient BiosciencesлҠ” AI кё°л°ҳ мӢ мһҘ лӘЁлҚё к°ңл°ңлЎң мЈјлӘ©л°ӣкі мһҲмңјл©°, мң лҹҪмқҳ EpiBoneмӮ¬лҠ” 3D н”„лҰ°нҢ… м—°кіЁ мЎ°м§Ғ мӢңмһҘмқ„ м„ лҸ„н•ҳкі мһҲлӢӨ. көӯлӮҙм—җм„ңлҠ” м…Җм•Өл°”мқҙмҳӨ, м нҒҗлҰӯмҠӨ, м ңл„ҘмӢ л“ұмқҙ мң л§қ кё°м—…мңјлЎң нҸүк°Җл°ӣкі мһҲлӢӨ.
н•ңкөӯмқҳ мһҘкё° мқҙмӢқ нҳ„нҷ©кіј кіјм ң
н•ңкөӯмқҖ мһҘкё° кё°мҰқ лҸҷмқҳмңЁмқҙ м—¬м „нһҲ лӮ®мқҖ нҺёмқҙл©°, мһҘкё° кё°мҰқ л¬ёнҷ” нҷ•мӮ°мқҙ мӢңкёүн•ң кіјм ңлЎң кјҪнһҢлӢӨ. н•ңкөӯмһҘкё°мЎ°м§Ғкё°мҰқмӣҗ(KODA)м—җ л”°лҘҙл©ҙ, мһҘкё° кё°мҰқ л“ұлЎқмһҗлҠ” 2024л…„ кё°мӨҖ 53л§Ң лӘ…мңјлЎң кҫёмӨҖнһҲ мҰқк°Җ 추세мқҙм§Җл§Ң, лҮҢмӮ¬ кё°мҰқмһҗлҠ” м—°к°„ м•Ҫ 450лӘ… мҲҳмӨҖм—җ лЁёл¬јкі мһҲлӢӨ.
лҢҖкё° нҷҳмһҗлҠ” м•Ҫ 5,500лӘ…м—җ лӢ¬н•ҳл©°, нҠ№нһҲ мӢ¬мһҘкіј нҸҗ мһҘкё°мқҳ мҲҳкёүмқҙ л§Өмҡ° л¶ҖмЎұн•ң мғҒнҷ©мқҙлӢӨ. м •л¶ҖлҠ” көҗмңЎкіј мә нҺҳмқёмқ„ нҷ•лҢҖн•ҳкі мһҲмңјл©°, көӯлӮҙ л°”мқҙмҳӨ кё°м—…л“ӨлҸ„ 3D л°”мқҙмҳӨн”„лҰ°нҢ…, мӨ„кё°м„ёнҸ¬ м№ҳлЈҢм ң к°ңл°ңм—җ лӮҳм„ңкі мһҲлӢӨ. м„ңмҡём•„мӮ°лі‘мӣҗкіј мӮјм„ұм„ңмҡёлі‘мӣҗмқҖ мқёкіө нҸҗ, мқёкіө мӢ¬мһҘ к°ңл°ңмқ„ мң„н•ң кіөлҸҷ м—°кө¬лҘј 진н–ү мӨ‘мқҙл©°, мөңк·ј AI кё°л°ҳ мһҘкё° л§Өм№ӯ мӢңмҠӨн…ң к°ңл°ңлҸ„ к°ҖмҶҚнҷ”лҗҳкі мһҲлӢӨ. н•ҳм§Җл§Ң лІ•В·м ңлҸ„ м •л№„мҷҖ н•Ёк»ҳ көӯлҜјм Ғ мқёмӢқ к°ңм„ л…ёл Ҙмқҙ лі‘н–үлҗҳм–ҙм•ј н•ңлӢӨлҠ” м§Җм Ғмқҙ л§ҺлӢӨ.
м •мұ… нҳҒмӢ мқҳ кіјм ң: кіөкіө-лҜјк°„ нҳ‘л Ҙ м „лһө
кёҖлЎңлІҢ нҠёл Ңл“ңлҠ” кіөкіөкіј лҜјк°„мқҳ нҳ‘л Ҙ к°•нҷ”лЎң лӮҳм•„к°Җкі мһҲлӢӨ. м •л¶ҖлҠ” м—°кө¬л№„ м§Җмӣҗкіј лІ•м Ғ м •л№„м—җ 집мӨ‘н•ҳкі , лҜјк°„мқҖ кё°мҲ к°ңл°ңкіј мғҒмҡ©нҷ”лҘј мЈјлҸ„н•ңлӢӨ.
лҜёкөӯмқҖ '21st Century Cures Act'лҘј нҶөн•ҙ мһ¬мғқмқҳн•ҷ м—°кө¬мҷҖ AI кё°л°ҳ мқҳлЈҢкё°кё° мҠ№мқё м Ҳм°ЁлҘј лҢҖнҸӯ к°ңм„ н–ҲлӢӨ. мң лҹҪмқҖ 'Horizon Europe' н”„лЎңк·ёлһЁмқ„ нҶөн•ҙ кҙҖл Ё м—°кө¬м—җ 2027л…„к№Ңм§Җ м•Ҫ 100м–ө мң лЎңлҘј нҲ¬мһ…н• кі„нҡҚмқҙлӢӨ. мқјліё нӣ„мғқм„ұмқҖ 'мІЁлӢЁмһ¬мғқмқҳлЈҢ к°ҖмҶҚнҷ” м „лһө'мқ„ 추진 мӨ‘мқҙл©°, н•ңкөӯлҸ„ 2024л…„л¶Җн„° 'мІЁлӢЁмһ¬мғқмқҳлЈҢ мңЎм„ұлІ•' мӢңн–үмңјлЎң кҙҖл Ё 분야 нҲ¬мһҗмҷҖ к·ңм ң к°ңм„ л…ёл Ҙмқ„ к°•нҷ”н•ҳкі мһҲлӢӨ. м •л¶ҖлҠ” 2025л…„к№Ңм§Җ л°”мқҙмҳӨ н—¬мҠӨ мӮ°м—… кёҖлЎңлІҢ кІҪмҹҒл Ҙ 10мң„к¶Ң 진мһ…мқ„ лӘ©н‘ңлЎң н•ҳкі мһҲмңјл©°, лҜјк°„ нҳ‘л Ҙмқ„ нҶөн•ң кёҖлЎңлІҢ м»ЁмҶҢмӢңм—„ кө¬м¶•м—җлҸ„ л°•м°ЁлҘј к°Җн•ҳкі мһҲлӢӨ.
лӢӨк°Җмҳ¬ 10л…„: мһҘкё° л¶ҖмЎұ н•ҙкІ°мқ„ мң„н•ң лҜёлһҳ мӢңлӮҳлҰ¬мҳӨ
н–Ҙнӣ„ 10л…„мқҖ мһҘкё° л¶ҖмЎұ н•ҙкІ°мқҳ 분мҲҳл №мқҙ лҗ кІғмқҙлӢӨ. 3D л°”мқҙмҳӨн”„лҰ°нҢ… мһҘкё°мқҳ мғҒмҡ©нҷ”, мң м „мһҗ нҺём§‘ мһҘкё°мқҳ мһ„мғҒ м„ұкіө, мқёкіө мһҘкё°мқҳ мӢңмһҘ нҷ•лҢҖк°Җ кё°лҢҖлҗңлӢӨ. лҸҷмӢңм—җ мңӨлҰ¬м Ғ, мӮ¬нҡҢм Ғ л…јмқҳлҸ„ лҚ”мҡұ м№ҳм—ҙн•ҙм§Ҳ м „л§қмқҙлӢӨ. кё°мҲ л°ңм „мқҙ мқёк°„ мғқлӘ… мЎҙм—„м„ұкіј мЎ°нҷ”лҘј мқҙлЈЁлҠ” л°©н–ҘмңјлЎң м •мұ…кіј мӮ¬нҡҢк°Җ 진нҷ”н• мҲҳ мһҲмқ„м§Җ, к·ё кіјм •мқҖ м—¬м „нһҲ 진н–үнҳ•мқҙлӢӨ.
McKinsey & Company ліҙкі м„ңм—җ л”°лҘҙл©ҙ 2030л…„кІҪ 3D н”„лҰ°нҢ…лҗң мӢ мһҘкіј к°„мқҳ мһ„мғҒ м Ғмҡ©мқҙ нҳ„мӢӨнҷ”лҗ кІғмңјлЎң ліҙмқҙл©°, кёҖлЎңлІҢ мһҘкё° л¶ҖмЎұ нҳ„мғҒмқҖ кё°мҲ кіј м ңлҸ„мқҳ л°ңм „мқ„ нҶөн•ҙ м җ진м ҒмңјлЎң мҷ„нҷ”лҗ кІғмңјлЎң кё°лҢҖлҗңлӢӨ. лҸҷмӢңм—җ мӮ¬нҡҢм Ғ н•©мқҳлҘј кё°л°ҳмңјлЎң н•ң мңӨлҰ¬м Ғ кё°мӨҖ л§Ҳл Ёкіј кіөм •н•ң мһҘкё° 분배 мІҙкі„ кө¬м¶•лҸ„ мӨ‘мҡ”н•ң кіјм ңлЎң л– мҳӨлҘҙкі мһҲлӢӨ.
* Referenc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lobal Observatory o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Reports, 2024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UNOS), Annual Data Report 2024
Nature Biotechnology, "Advances in 3D Bioprinting for Organ Regeneration", 2024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CRISPR Gene Editing in Organ Transplantation", 2024
The Lancet, "Trends in Artificial Organs and Xenotransplantation", 2025
н•ңкөӯмһҘкё°мЎ°м§Ғкё°мҰқмӣҗ(KODA), 2024 м—°лЎҖ ліҙкі м„ң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ublic of Korea,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in Korea", 2024
McKinsey & Company, "Biotech Investment Trends 2025"
PwC, "Global Healthcare Market Analysis", 2025
Harvard Wyss Institute Research Publications, 2024
Cellink, Corporate Reports 2024
eGenesis Corporate Press Release, 2024
European Commission, Horizon Europe Program Brief, 2025
NIH Xenotransplantation Guidelines, 2025
OECD Health Policy Studies, "Organ Donation: Policy Challenges", 2024
Stanford University AI in Healthcare Reports, 2025
Tokyo University Medical Robotics Lab Publications, 2024
Viscient Biosciences Investor Reports, 2025
Korean Advanced Bioprinting Forum Proceedings, 2025